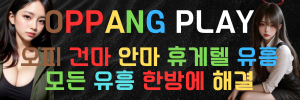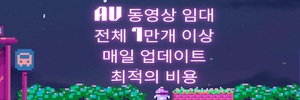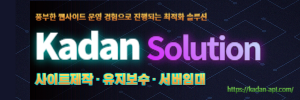오빠의 노예 - 16
오빠의 노예 - 16

그가 이제 표피까지 까서 예민한 꼭지를 문지르니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이 나왔다.
그는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느릿한 키스를 해댔다. 그사이 만족감과 흥분이 교차하는 두 시선이 뒤얽혔다.
“영아야.”
“네, 오빠.”
그가 그녀의 귓불을 가만히 만지작거리자 그녀의 가쁜 숨결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빤히 보다 그녀의 귓가에 천천히 속삭였다.
“네가 너무 좋다.”
“나도 오빠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는 거친 숨결을 내뿜으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사이판 내일모레 떠나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게나 빨리?”
“그럼, 의지가 있으면 뭘 못 하겠어.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어. 이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이제야 인정하다니.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아 버렸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폭풍 전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하니 조급해졌다.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폭풍이 거세게 불어도 영아를 지켜야 하는데.
“뭐예요? 그럼 내가 일보다 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신나게 물었다. 그는 그런 그녀가 귀여워 양 볼을 잡고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이럴 때는 네가 선생님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 휴, 언제 이렇게 자라서 네가 선생님이 됐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린 시간은 그에게는 결코 짧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어른이 되자마자 바로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그에게 금단의 열매였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걸 너무나 잘 알지만 죽을 것 같아서 한 모금만 더 한 모금만 더 하며 생명 줄을 잡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언제쯤이면 이 타는 듯한 갈증이 해소될까?
“오빠도 내 학생이 되어 볼래요?”
“학생은 너지. 내가 아니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학생이지. 내 자랑도 노련하게 가지고 놀잖아.”
태욱이 영아의 손을 잡고 방금 전 그녀의 안에서 마음껏 드나들었던 물건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손이 닿기 무섭게 곧추서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주인이었다.
“자랑스럽기는 하죠. 이렇게 큰 무기로 나를 엄청 즐겁게 해주니 말이죠.”
그녀의 칭찬에 그는 설레고 흐뭇했다. 다 봤는데도 또 이렇게 말로 들으니 또 좋았다.
“얼마나? 내가 널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데?”
그가 식탁에서 먼저 내려와서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그를 올려다봤다.
“오빠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을 알게 된답니다. 그것도 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또 느끼니까. 자꾸 기대되고. 더 해요?”
듣기만 해도 벅찼다. 무슨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사영아 감수성은 그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럴 때는 존경스러울 지경이었다. 그의 표현력은 그녀에 비해서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표현은커녕 그의 마음을 아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인간다운 매력이 없는 그를 영아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시 만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그 차이점이 그를 초조하게 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면 좋은 의미지만 그녀는 반대였다면 어쩌나 싶은 게 어딘가 알싸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의미였고, 그는 늙는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은 단단해질 때였고, 그녀의 마음은 변할 수도 있을 때기도 했다.
그녀를 믿고 싶지만 만약 세상이 뒤집어진다면 그녀가 누구를 선택할까? 그녀에게 부친이 약점이라는 건 그도 잘 알았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녀였지만 그녀에게 과연 그가 절대적인 존재일까?
그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두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그일까? 부친일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친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부친은 그녀의 약점이었지만 그는 약점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그는 서운했다.
그녀에게만큼은 그가 1순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보다. 불가능한 욕심인데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응, 더 해줘.”
그가 그녀를 벽면에 붙인 채 지그시 내려다보며 졸랐다.
이렇게 계속 안고 있는데도 그녀는 너무 작고 뼈대도 약해서 팔도 아프지 않았다.
그 가벼움이 그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가 언제 어디서든 그녀를 지켜 줘야 할 것 같은 기사도 정신이 불끈불끈 솟는 걸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었다.
그와 함께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책감도 그를 괴롭혔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외면하는 건 그의 성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직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걸까 싶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공간, 골짜기에서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는 게 길이었다. 세상이 밀어내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 과연 있을까?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망각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실은 그게 더 끌렸다. 지금은 그러고 싶었다. 그게 그가 사는 길이니까.
살고 싶었다. 생존 욕구는 누구나 강한 법이니까. 그게 죄악이라면 기꺼이 짓고 싶었다.
“나중에요.”
“뭐?”
“한꺼번에 다 해주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그를 놀릴 줄도 알고 제법이었다. 훌쩍 자란 그녀가 대견하면서도 너무 자라서 그의 손에 잡히지 않을까 봐 그만 자랐으면 싶었다.
“사영아 너?”
“내가 뭐요?”
“영악해졌어. 순한 양이 고양이가 다 됐어. 혹시 날카로운 발톱도 있는 거 아냐?”
설령 할퀸다고 해도 몸을 사릴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준 생채기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했다. 당연했다. 값진 보석은 대가 없이 가질 수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오빠를 향해 세울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발톱은 숨기고 발바닥으로 살살 간질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요것 봐라. 내가 놀이 상대야?”
“그럼요. 진지한 건 싫어요. 왠지 슬퍼질 것 같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은 그가 긴 숨을 내뱉었다.
“진지하다고 슬퍼지진 않아.”
그가 이마를 맞붙인 채 그녀의 눈 속을 파고들 듯이 시선에 힘을 주었다.
“과연 그럴까요?”
“왜 그래? 그 나이는 마냥 낙관적일 때인데.”
“오빠는 그랬어요?”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의 검은 눈동자 가득 어두운 불길이 일었다.